비단 어제 오늘 거론되는 문제는 아니나 요즘들어 극장에 걸리는 영화의 제목들을 보노라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대부분은 얄팍한 장삿속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작명센스가 발바닥이라 오히려 영화제목이 안티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관람 의욕을 꺾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수입영화들의 어처구니없는 제목 장난질을 규탄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과거에는 영어식 제목을 무조건적으로 한글화 시킬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든지 [내일을 향해 쏴라], [언제나 마음은 태양] 같은 원제목과는 동떨어진 한글 제목이 만들어지긴 했어도 그 시대에는 그나마 낭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같아서는 정말 생각을 하고 제목을 짓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최근 개봉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는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수입사의 (여기서 영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수입사가 되었건 배급사가 되었건, 또는 홍보사가 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일단 본 포스팅에서는 수입사로 통일하겠다) 근시안적 태도가 미친 결과다. 무슨 얘기냐고? 원래 시리즈의 1편이었던 [데스티네이션]은 원제가 [Final Destination]이었는데, 수입사에서 개봉당시 'Final'은 잘라 버리고, 그냥 [데스티네이션]으로 개봉해 버렸다.
ⓒ New Line Cinema. All Rights Reserved.
여기까진 좋다. 2편이 개봉되었을 때도 수입사는 [데스티네이션 2]라고 개봉했고 이는 'Final'을 잘라 버린 1편과 일관성을 잘 유지한 셈이다. 그런데 3편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느닷없이 3편은 [데스티네이션 3]가 아니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개봉해 버린 것이다. 아마도 3편이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한 수입사 측의 실수였다. 당연히 원제는 [Final Destination 3]로 북미측에서는 정상적(?)인 수순을 밟았다.
뭐 좋다. 아직까진. 그런데 예상을 깨고 4편이 등장한 거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수입사가 이도저도 손을 쓰지 못하도록 북미측 제목도 요상하게 지어졌다. [The Final Destination]. 1편의 원제에 'The' 하나만 갖다붙인 이 작품으로 국내판 제목은 꽤나 골치아프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4]다.
ⓒ New Line Cinema. All Rights Reserved.
3편의 제목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었음을 감안하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2,3]은 건너뛰고 느닷없이 4편이 개봉한 꼴이 되어 버린 거다. 그냥 정상적으로 3편을 [데스티네이션 3]라 하고, 4편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 했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 오히려 The의 유무를 제목에서 표현해내기 애매한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면 차라리 1편부터 'Final'을 빼 버린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터인데 말이다.
이런 성급한 예는 또 있다. 국내 수입사들은 성질 급한 한국인이라는 걸 티라도 내듯이 정식 속편이 나올때까지 도무지 참는 법이 없다. 1991년 [늑대와 춤을]의 화제성에 편승해 슬그머니 [늑대개]로 개봉한 [White Fang]의 경우를 보자. 작명센스도 압권이지만 사실 [늑대개]는 그 짝퉁스런 제목에 비하면 썩 괜찮은 작품이었다. 그로인해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비디오 시장에서 제법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갑자기 뭔 배짱이 생겼는지 나오지도 않은 [늑대개 2]가 출시되기에 이른다. 당연히 이 작품은 1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Iron Will]이란 작품이었다.
ⓒ Walt Disney Pictures. All rights reserved.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진짜 속편인 [White Fang 2: Myth Of The White Wolf]가 나온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늑대개 3]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어 2편이 3편이 되어버리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만다.
ⓒ Walt Disney Pictures. All rights reserved.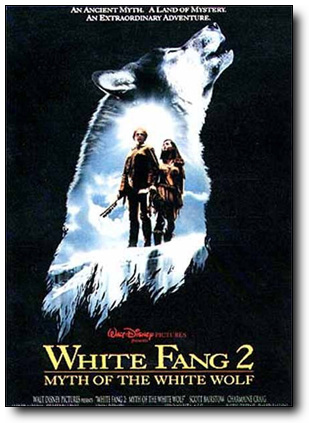
[옹박]도 마찬가지다. 토니 자의 리얼 액션이 화제가 된 [옹박]은 비록 극장에선 큰 흥행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나 대여시장 및 다운로드를 통해 인지도를 급속히 확산시킨 영화다. 제법 토니 자의 이름이 알려지자 수입사는 [똠양꿍]이라는 토니 자의 다른 작품을 [옹박: 두 번째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해 관객들을 기만한다. 그러나 몇 년 뒤 오리지널 속편인 [옹박 2]가 나왔고, 수입사에서는 이를 [옹박 2]라 하지 못하고 [옹박: 더 레전드]라는 듣보잡 부제를 붙여 개봉하게 된다.
ⓒ Baa-Ram-Ewe/Sahamongkolfilm Co. All rights reserved.
정식 속편과 짝퉁이 뒤바뀌어 소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양자경의 시원한 액션이 돋보이는 [예스마담] 시리즈의 경우다. 당시 양자경은 [예스마담 1,2]의 촬영 후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다. [예스마담] 시리즈의 정통을 이은 여배우는 미모와 액션연기를 겸비한 양리칭이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국내에는 양자경이 주연했던 영화 [중화전사 (Magnificent Warriors)]가 [예스마담 3]로 소개되는 바람에 정작 양리칭이 주연을 맡은 정식 속편인 [예스마담 3: 자웅대도(In The Line Of Duty 3)]는 [양리칭의 예스마담]으로 소개되어 짝퉁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 D & B Films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같은 사태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양자경의 [통천대도 (Easy Money)]가 [예스마담 4]로, 양리칭의 [예스마담 4: 직격증인 (1989, In The Line Of Duty 4 : Witness)]은 여전히 양리칭의 짝퉁버전으로 인식되어 버렸다. 심지어 신시아 로스록(나부락)의 [마비취(Magic Crystal)]도 여기에 가세해 마치 예스마담의 4탄인양 행세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다. 이후 양리칭은 정통 [예스마담] 시리즈의 주연으로 활약했지만 국내에서 [예스마담]의 계보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전혀 관련도 없는 아류작을 정식 속편인냥 출시하는 경우는 이 포스트에서 모두 언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메멘토 2 (원제: The Attic Expeditions)], [레저렉션 2 (원제: Sanctimony)], [유주얼 서스펙트 2 (원제: The Contract)] 등 생각을 떠올릴수록 혈압만 올라가니 이쯤에서 멈추자.
ⓒ Regent Entertainment.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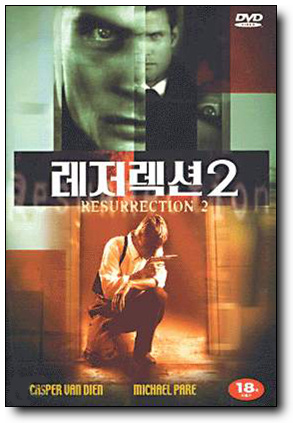
속편 제목의 장난질에 더해 국내 제목의 오류는 가관이다. 올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을 보자. 이 부분은 영화가 개봉되기 훨씬 전부터 DVD Prime 등 각종 영화사이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작품의 원래 부제인 [Revenge of Fallen]은 폴른(Fallen)이라는 캐릭터의 복수를 합축적으로 담은 것이다. 그러나 국내 수입사는 Fallen을 '패자'라는 상투적인 의미로 번역했고, 복수라는 뜻의 'Revenge'는 'Strike back'에 가까운 '역습'으로 번역해 '패자의 역습'이라는 말도 안되는 제목을 끝까지 고집했다.
ⓒ DreamWorks SKG/Paramount Pictures. All rights reserved.
때론 없는 제목을 만들어 내는 것도 국내 극장가의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옹박]의 사례 외에도 [분노의 질주]로 소개된 [The Fast and the Furious] 시리즈는 사실 북미 버전의 원제도 오락가락 장난질을 해놨긴 하다만 (2편이 [2 Fast 2 Furious], 3편이 [The Fast and the Furious: Tokyo Drift]로 다소 변칙적이다) 4편의 국내 제목은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로 도대체 뭐가 오리지널이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부제가 떡하니 붙어있다. 그럼 그전까지 속편은 가짜였단 말인가.
ⓒ Universal Pictures. All rights reserved.
[스타트렉: 더 비기닝]의 경우도 마찬가지. 시리즈의 순서상 11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작품은 원제가 그냥 [Star Trek]으로 1966년에 시작된 TV시리즈와 같다. 물론 작품의 성격이 프리퀄에 가까운 것이긴해도 왜 감독이 이 작품을 단순히 [Star Trek 11]이나 국내판처럼 [Star Trek: The Beginning]으로 하지 않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을 국내 관객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무시하고 싶을까.
ⓒ Paramount Pictures. All rights reserved.
영화의 제목에서 감독의 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는 결코 쉽게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단적인 예로 팀 버튼 감독이 왜 [배트맨]의 속편을 [Batman Returns]라 했는지 수입사는 [배트맨 2]라는 제목을 정하기 전해 한번쯤 생각해 봤어야 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 [다크 나이트]가 개봉했을 때 [배트맨: 다크 나이트]나 [배트맨 비긴즈 2]로 개봉하려 했으면 불싸지를 뻔 했다. ㅡㅡ;;
ⓒ Warner Bros. Pictures. All rights reserved.
그외에도 007시리즈 18편 [The World Is Not Enough]를 원제와는 무관한 [언리미티드]로 개명한 것이나 웨스 크레이븐의 [Red eye]를 국내 공포영화와 제목이 같다는 이유로 [나이트 플라이어]라는 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도 웬만하면 자제를 요망하는 바이다. 테리 길리엄의 걸작 컬트영화 [Brazil]을 [여인의 음모]로 바꿔놓은 건 정말이지 압권이다. 물론 개중에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 (원제 : The Cure)]처럼 국내에서 개명한 제목이 더 좋을 때가 간혹 있긴 하나, 내 기억으론 가뭄에 콩나듯 하나 나올까 말까다.
ⓒ Universal Home Entertainment. All rights reserved.
국내 수입외화의 제목변경에 대해서는 정말 할말이 많지만 이 정도만 열거해도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바 필자가 말하고자하는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본다. 자신이 없다면 직역으로 음역해도 좋다. 차라리 [The Rock]을 그냥 [더 록]으로 번역하는게 깔끔하다. '알카트라즈 작전'이라든가 '숀 코네리의 탈출'처럼 촌발날리는 제목으로 완전히 망치는 거 보단 낫다는 얘기다.
관객에게는 영화를 있는 그대로 봐야할 권리가 있다. 비단 영화의 본편만이 아니라 제목도 '작품'의 일부임을 인정하라. 언제까지고 제목 장난질로 관객들을 우롱하며 관객의 수준을 무시할 생각인가. 지금은 21세기다. 글로벌 시대에 쌍팔년도 이전에나 통할법한 만행을 지금이라도 그만두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 본 포스트에 사용된 모든 스틸 및 사진은 인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관련된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 소유됨을 알립니다.
'영화에 관한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번 주말엔 무슨 영화를 볼까? - 2009년 10월 넷째주 (15) | 2009.10.23 |
|---|---|
| 제1회 DMZ 다큐멘터리영화제(DMZ Docs)를 소개합니다. (6) | 2009.10.15 |
| 이번 주말엔 무슨 영화를 볼까? - 2009년 10월 둘째주 (10) | 2009.10.09 |
| 제3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SIFFF)를 소개합니다 (5) | 2009.10.06 |
| 이번 주말엔 무슨 영화를 볼까? - 2009년 9월 넷째주 (6) | 2009.09.25 |

